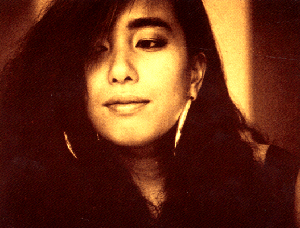
오늘 소개하는 작가 야마다 에이미. 1959년생으로 연애 소설의 여왕, 연애의 달인으로 불리는 작가이다. 1985년에 데뷔를 할 때 흑인 병사와 동거를 하는 등의 사생활이 화제가 되었으며 한동안 일본에서는 섹스에 대해 과감하게 말하는 것을 "야마다 에이미적으로 말하자면…"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10년쯤 전이었나 보다. 시내 대형 서점에 깔린 B6 사이즈에 초록색 표지의 하드 커버 소설책 제목이었다. <120% Coool>. 오고 가면서 몇 번이나 그 이채로운 제목에 눈길이 가면서도 이상하게 선뜻 손이 가지 않아서 자꾸 눈에 밟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다. 내가 그 책을 결국 구입한 것은 그 후로 3, 4년은 더 지난 후였다.
그리고 지금은 야마다 에이미라는 작가의 이름만 봐도 망설이지 않고 무조건 구입을 하게 되었다. 내가 가장 최근에 야마다 에이미라는 이름을 활자로 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일본 여성 작가의 저자 소개 글이었다. 일본에서는 요시모토 바나나, 에쿠니 가오리, 그리고 야마다 에이미, 이 세 사람을 묶어 3대 여성 작가라고 한다는데 야마다 에이미의 팬인 나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요시모토 바나나나 에쿠니 가오리에 비해 지명도도 인기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적이 속상하다. 그래서 이번 글은 야마다 에이미라는 일본 여성 작가의 소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내 마음대로.
요시모토 바나나의 글이 순정 만화라면 야마다 에이미는 레이디스 코믹스이다. 야마다 에이미의 소설을 읽어보면 아, 이 사람 연애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해봤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사랑이 아닌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일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커다랗고 대단한 한 번의 연애였든 아니면 쿨하고 멋지며 가벼운 여러 번의 연애였든 그건 상관없다. 읽다 보면 '사부' 소리가 절로 나오고 어떤 순간적인 감정과 생각, 감각을 절묘하게 포착하여 그려낸 생생한 묘사에 소름이 돋는다. 이 작가는 순수하게 여자가 여자인 순간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는 환상적인 솜씨를 발휘하며 또한 여자에게 있어 남자가 남자인 순간을 가슴이 서늘해질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준다.
야마다 에이미의 소설에 나오는 남녀 관계는, 연애는 쿨하다. 이 쿨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녀의 소설을 읽고 나서 느끼는 것은 쿨(Cool)이라는 이 단어다. 오죽하면 단편집 제목이 120% Coool일까. 100%도 아닌 120%를 지향하고 그냥 Cool이 아닌 O가 하나 더 들어간 Coool이다. 하지만 그저 쿨하기만 하지 않다. 쿨이라는 말, 쿨하다는 말은 어떤 이의 행동에 대해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이다. 그 뒷면에, 그 아래에 흐르는 감정의 흐름, 서늘함, 축축함, 끈적거림 또한 야마다 에이미는 놓치지 않는다. 어쩌면 120%까지 쿨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쿨함 아래 숨어있는, 쿨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한 긍정이면서 부정인 것이다.
ㅣ120% cool
어렸을 때 여름방학에 바다에서 수영한 오후,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나오질 않아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누워 있었을 때. 볕에 탄 모래에 이끌리듯 귀에서 흘러나온 바닷물. 그의 체액은 그것을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우스워졌다. 그러고 보니 원래 우리는 바다에 가자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우선 비슷한 곳에 가긴 간 것이다. 뜨겁고 완만하고 빠져버릴 것 같다는 점에서.
- <신문> 중에서
9개의 단편이 실린 이 단편집을 덮고 나서 제일 인상에 남았던 구절 중 하나이다. 섹스를 마치고 남자의 방을 걸어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다리 사이로 남자의 정액이 흐르는 그 선뜻한 느낌을 야마다 에이미는 이렇게 비유했다. 야마다 에이미의 소설은 장편도 좋지만 역시 단편 소설이 매력이 있다. 딱히 어떤 줄거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섹스를 하고 섹스를 통해 마음의 물길이 생겨 고운 모래가 깔린 모래사장에 그림을 그린다. 그 그림은 형태가 없는 듯 하면서도 어떤 모양과 닮기도 하여 본 듯한 모양이 되기도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물기가 마르면서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이 단편집은 야마다 에이미의 감각적인 문체와 묘사, 비유가 가장 절정에 오른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읽고 있노라면 오감을 자극한다. 때로는 서늘하지만 서글프지 않고, 때로는 유쾌하지만 뒷통수를 치는 그런 단편들이다.
ㅣ공주님
손을 등뒤로 돌리는 건 정열적인 동작인 것 같군요. 자동차. 피아노. 그러면 손을 등뒤로 돌려서 문을 닫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건 문의 안쪽에 있는 경우와 바깥쪽에 있는 경우에 따라서 전혀 다를 것 같습니다. 나와 그의 관계는 그가 안쪽에서 손을 뒤로 하여 문을 닫았을 때 시작해서, 내가 바깥쪽에서 역시 손을 뒤로 하여 문을 닫았을 때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 끝났는지도 모릅니다.
- <체온 재기>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발매된 야마다 에이미의 책이다. 앞에 소개한 <120% COOOL>과 비교를 하다보면 이 작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 짐작할 수 있어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사랑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의 컨셉을 절묘하게 엮은 단편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제 작가는 관찰과 묘사를 지나 탐구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에 작가가 연애와 섹스 그 자체를 탐구했다면 요즘 작품들은 연애와 섹스를 통해 삶을 탐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마 이 단편집 전체를 꿰뚫는 죽음이라는 주제가 내 느낌의 증거일 것이다.
ㅣA 2 Z
앞에 소개한 두 권과 달리 은 장편 소설이다. A로 시작해서 Z로 끝나는 단어로 각 챕터의 소제목을 달아두었지만 작가는 마지막에는 관계를 묘사하는 말은 단 한 단어일 수도 있고, 한 단어도 없을 수 있다고 주인공의 입을 빌어 밝혀두었다. 편집자라는 직업을 가진 아이가 없는 서른 다섯의 맞벌이 부부가 각각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서로에게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그렸다, 가 이 소설의 줄거리이겠지만 사실 이 소설은 여자 주인공 나츠미와 연하의 우체국 직원 나루오의 연애 이야기이다. 그러나 정작 야마다 에이미 다움이 이 소설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서로의 깊숙한 영역에 발을 들이고 있는 나츠미 부부가 각자 하나의 연애를 끝내고 서로 돌아온다는 마지막이 아닌가 싶다.
그때, 나는, 지독한 근시인 그가 필수품인 안경을 끼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안경집이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한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벌떡 일어섰다. 나는, 그가 눈앞의 소설보다 염려하는 게 무언지, 알고 있다.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이야기하고 싶다. 모조리 말하고 싶다. 들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당신의 얘기도 듣고 싶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사랑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어른이 되려 하지만 결코 될 수 없는 자들의, 너무도 안타까운 묘미다.
- 중에서
|
NEW

 팩토리_Article > 섹스앤컬쳐
팩토리_Article > 섹스앤컬쳐